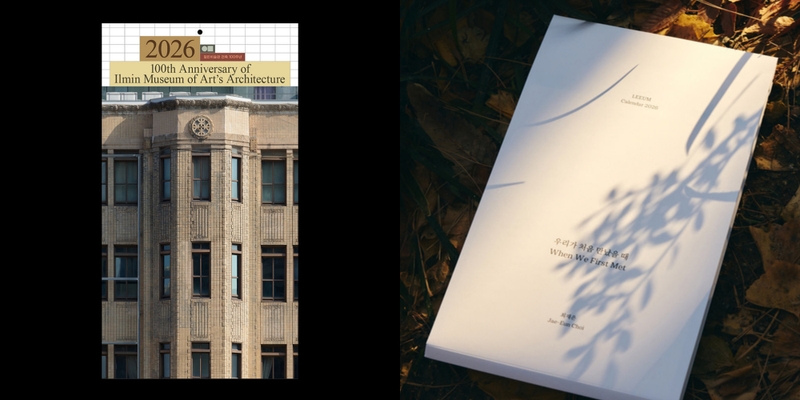신봉철 작가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오는 빛이 지구상의 사물에 부딪히기 직전 찰나의 순간에 잠시 개입한다. 유리를 통해 빛을 굴절시키고, 채색시키고, 반사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작가는 ‘우주적 사건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1,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하여 많은 성당과 건축물이 파괴되었던 유럽은 마티스(Henri Matisse), 샤갈(Marc Chagall), 레제(Fernand leger) 등의 예술가들에게 이러한 건물 내의 작품을 복원할 기회를 주었다. 이 작가들은 현대미술의 언어로 유리화에 접근해 기술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신봉철 작가가 유리라는 매체에 대한 연구를 이어 나가기 위하여 독일행을 결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이후 유럽에서 활동하며 유럽 미술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아온 신봉철 작가는 지난 2019년 한국 파라다이스 시티의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 초청받아 <프리즘 판타지 : 빛을 읽는 새로운 방법>展이라는 그룹전에 참가하여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위로의 시선>이 특별히 가지는 의미가 있나요?
지난 6월 달에 독일 쾰른에서 라는 개인전을 했어요. 그 개인전을 준비하며 혼자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예술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예술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약간의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간의 저는 예술이 기성 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계속해서 전복해서 나아가는 전위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작업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읽었던 문학 작품, 들었던 음악 등 예술 작품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예술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실증을 몸소 경험한 셈이에요. 이런 시기를 보내기 전까지는, 타인의 아픔에 잘 공감하지 못했어요. 스스로조차 나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보듬어 주는 데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저의 작업 역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술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가 작업에까지 반영되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더 그레잇 컬렉션’에서 개최하는 전시의 작품 중 하나를 예시로 삼아야겠네요. 유리병 조각을 주요 매체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의 이름은 “Even if you don’t recognize me, I love you”인데요. 이 작품에는 어떠한 글자가 써져 있는데, 이 글자 주변이 유리 조각으로 덮어져 있어 처음에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 차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곳에 작품의 제목과 같은 말이 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당신이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죠.

최근 작업에서는 작가의 심상을 반영한 듯한 텍스트가 눈에 띄어요. 작품의 제목들도 정말 재미있고요.
저는 유리와 텍스트가 매체로서의 유사성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유리 창문을 볼 때 창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이 보여주는 너머의 풍경을 보잖아요. 텍스트 역시 글자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닌 그 글자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제 작품 중 “one more light”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인 린킨파크의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올 봄에 자주 들었던 노래인데요. 가사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수백 만 개의 별 중에, 빛 하나 꺼진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이 노래는 린킨파크의 싱어 체스터가 자살하기 전 공연에서 불렀던 것이기도 해요. 이 노랫말을 들으면 인생의 허망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도 해요. 삶이란 게 그다지 거창한 것이 아니므로 조금 더 가볍게 살아보자는 거죠. 이 작품을 외부에 전시한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보면 정말 별이 빛나는 것처럼 반짝반짝 해요. 깨진 유리 조각이 조명을 받으며 굴절이 되어 별처럼 발광해요. 이 작업을 하며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 때마다 아까의 노래를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신경 쓰지. I Do”하고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작가가 직접 소개하는 이번 전시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더 그레잇 컬렉션’은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소규모 전시 공간이에요. 전통적인 화이트 큐브의 공간이 아니고 신사장 양옥 2층을 전시 공간으로 개조한 곳이어서 층고도 낮고 이동하는 데 불편함도 있죠. 하지만 작은 공간 안에서 작품들이 가깝게 있다 보니 각 작품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같아요. 미세한 변화조차 아주 크게 느껴지죠. ‘더 그레잇 컬렉션’ 윗층에는 다락방이 있는데, 천장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1층이 우유곽처럼 네모난 데 반해 2층은 기울어져 있다니 재미있죠. 사람이 완전히 몸을 펴고 설 수도 없을 만큼의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무엇에도 방해 받지 않고 오롯이 작품과 나만이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공간에 어떤 작품을 전시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른 작품이 바로 “You’ll never walk alone”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그레잇 컬렉션에서 다가오는 10월 16일까지 개인전을 합니다. 또, 청주시립미술관 그룹전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전시는 17일날 시작하는데, 개막은 18일 날서울에서 합니다. 저의 대표작으로 여겨지는 색유리를 벽에 설치해서 조명이 나오면 그림자가 지고, 색깔이 바뀌는 기존의 작업들로부터 그 형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또, 약 4m 정도 되는 대형 작업이 세 개 정도 공개됩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주 금요일에 덴마크에서 개최되는 유러피안 글래스 콘테스트(European Glass Context)라는 비엔날레에 초청을 받아 전시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개인전이랑 일정이 겹쳐 갈 수는 없지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엔날레가 본 홀름이라는 섬에서 열리는데, 섬에 있는 미술관이어서 특히 더 관심이 가요.
신봉철
독일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며 유리를 매체 및 작품 언어로 ‘빛의 예술을 추구해왔다. 벽면의 부조, 조각, 평면 등의 방식으로 진화하며 창문과 인공조명에서 발산된 빛은 작품을 통과해 방향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빛의 궤적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스테인드글라스를 시작으로 색유리를 주요하게 다루며 자연성을 활용한 유리 설치 작업에 탁월하다.
더 그레잇 컬렉션
‘위대한 수집’이라는 의미로, 컬렉션 즉 ‘사적인 수집’을 위한 접근이 전시를 경험하고 읽는 방식에 어떠한 관점을 미치는지 타진 해보는 기획전시 시리즈. 옛 신사장 여관이 있던 곳에 위치한 오래된 양옥 이층집 거실을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공간적인 서사가 가능한 유휴공간들을 탐색해 나가며 다양한 창작가들이 교류하고, 소통을 도모하며, 협업을 모색하는 사랑방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글 신은별
자료 협조 더 그레잇 컬렉션